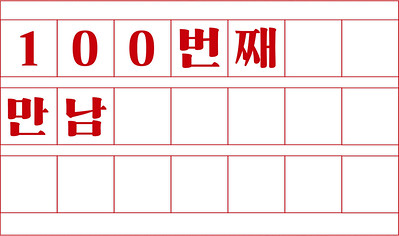작년 겨울, 회원들의 얼굴로 빼곡히 채워진 책을 선물 받았다. 자그마치 8년 동안 써오던 <만남> 코너를 그만두며 받은 인터뷰 모음집이었다. 지켜보는 눈이 있어 그 자리에서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멋쩍게 웃기만 했지만, 집에 돌아와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결국 눈물을 흘렸다.
인터뷰를 쓰는 동안 난 본명보다 ‘호모아줌마데스’라는 필명으로 더 유명(?)했다. 이름이 익숙지 않은 분들은 “혹시 합기도 빨간 띠…, 그분이세요?”라고 묻기도 했다. 회원 인터뷰 잘 보고 있다는 인사도 많이 받았다. <만남>이라는 코너는 그렇게 ‘딸 둘을 둔 아줌마’가 ‘글 쓰는 멋진 엄마’로 개벽한 희대의 사건이었다.
이후 일 년이 흐르고, <만남> 100회째를 축하하는 원고를 청탁받았다. 다시 그 책을 꺼내 지난 얼굴들과 마주한다. 쓰라는 원고는 안 쓰고 그들의 이야기에 파묻혀 나는 또, 웃다, 울다, 한다.
여러 얼굴이 스친다. A4용지가 부족할 때면 차 트렁크 한 가득 종이를 싣고 참여연대로 달려오는 회원, 중증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집회 참석에 열성인 회원, 탱고를 출 때 ‘심장은 하나, 다리는 넷’이 된다며 유쾌하게 웃던 회원, 인터뷰차 참여연대를 처음 방문하면서 두 손에 치킨을 들고 왔던 회원도 기억난다. 장담컨대, 참여연대에서 이렇게 많은 회원을 일대일로 만나본 건 내가 1등이 아닐까 싶다.
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‘시민’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. 그 단어가 오늘날 이렇게 당연해지기까지 수많은 이들이 짊어졌던 역사의 무게도 되돌아본다. 그동안 만났던 회원들은 내게 묻곤 했다. 자신은 훌륭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왜 인터뷰를 하느냐고. 그리곤 인터뷰 말미쯤엔 언제나 세상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한숨처럼 소망을 털어놓았다.
“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느냐를 기준으로 삼지 말라. 내가 어제보다 오늘 얼마나 좋아졌냐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. 그렇게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.”
그들은, 훌륭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. 그러나 내 눈에 그들은,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세상이 나아지길 꿈꾸며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딘 이들이다. 그렇게 ‘나’부터 시작한 사람들이다. 참여연대 회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14,944명 모두가 그러하다.
이번 회원특별호를 나를 포함해, 평범함으로 똘똘 뭉친 일만사천구백사십사 명의 회원에게 보낸다.
글. 호모아줌마데스
정부지원금 0%,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
참여연대 후원/회원가입